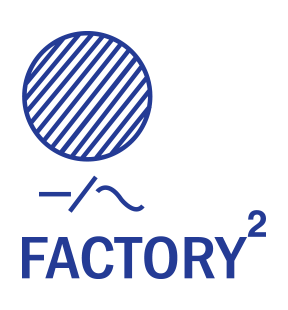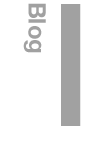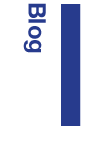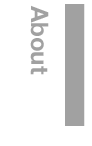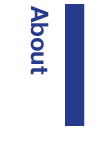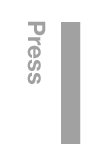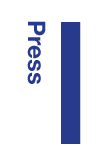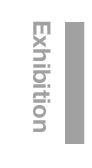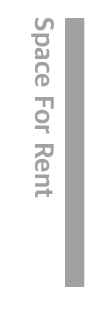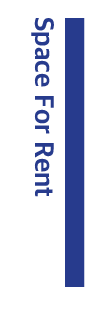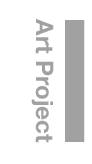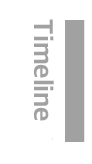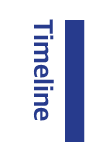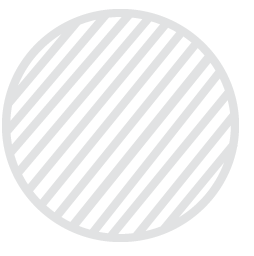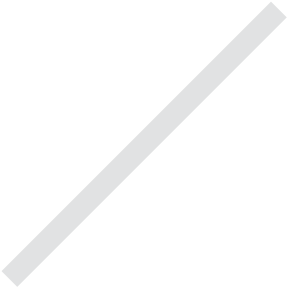| Surfaces of Listening Surfaces of Listening |
| 2012.5.18_6.10 |
Surfaces of Listening
by 김온
전시개요
갤러리팩토리의 <2012 Art & Text> 첫번째 전시인 김온 작가의 개인전인 “Surfaces of Listening” 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Surfaces of Listening” 는 저변에 조용히 또는 늘 그렇듯 존재하고 있는, 수동적 감각인 “듣기”라는 행위의 잠재성을 조형적 어법으로 주목한다. 소리를 통해 시각화가 가능하다면, 소리의 수렴 행위인 듣기라는 지각행위가 능동화를 유발하는 시각적 상황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다양한 매개를 통해 ‘표면화’되어 그 무언가로 불리워지기를 기다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의 깊은 표면에 내재적으로 유유하는 청각 행위에 조형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온 작가는 다양한 매체와 퍼포먼스를 통하여 쓰기, 읽기, 듣기 행위에 관한 작업들을 진행해오면서 이번 전시에서는 듣기라는 행위를,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표면의 상태와 태도로 간주하고 이루어진 작업으로 전시를 구성한다. <듣기 위한 쓰기 연습>이라는 주제로 된 시리즈 작업 중 드로잉과 병행된 설치작업, 텍스트 설치작업과 청취를 위한 무성 영상 설치 작업등으로 표면화 되고 서로 관계하여 구축된다.
특히, 이번 작업을 통해 조형적으로 여과되어 듣기라는 행위를 소환하는 작업들은 관객에게 읽혀질 또는 듣게 될 비물질적인 제 2의 텍스트의 파생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작가노트
“차가워지기 위해서 뜨거워져야하는
이상하고도 역설적인 냉장고 앞에서
나는 뜻밖의 목마름이 느꼈다.”
- 발화된 언어는 늘 공기 (空氣)안에서 축배를 올린다-
소리를 읽기 위한 시각의 듣기 연습
─ 김온: 청취의 표면들과 응시의 지층들
최 정 우
작곡가, 비평가, ‘사유의 악보’ 저자.
1
여기 그리고 다른 곳(ici et ailleurs). 2009년 흑석동에서였을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김온의 작품을 마주했던 때와 곳은. 어쩌면, 마치 그런 때와 그런 곳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왠지 그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마주쳤던 시간과 장소에서는 초현실(超現實) 혹은 과현실(過現實)의 냄새가 났다. 그 탈(脫)-시간과 비(非)-장소에서 내가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김온 작품들의 제목이 아마도 나의 이러한 기이한 감각의 중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나의 이러한 낯선 기억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터인데, 그 제목들은 각각 <지친 자의 유토피아(Utopie d'un homme qui est fatigue)>와 <그런 곳은 없다(Un tel lieu n'existe pas)>이었기 때문이었다.
2
파여 없어진, 통째로 실종된 텍스트들 앞에서, 그 텍스트들의 흔적으로만 남은 네모반듯한 구멍들 앞에서, 나는 유토피아를 찾다가 난파당한, 말 그대로 지친 자의 심정이 되었던 것(그러나 그 지친 자는 또한 바로 그 구멍 혹은 공허 속에서 어떤 안식의 검은 빛을 보았던 것), 혹은 내가 찾아 헤맸(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며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자들은, 모두 기화되거나 증발되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른 소리로 재생되고 있었던 것. 그렇다, 아마도 그곳은 다른 곳(ailleurs)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소리의 발신지이자 다른 발음의 발원지였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
3
별다를 것 없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유별날 것도 없는 동그랗고 하얀 의자 위에 놓여진, 역시나 그렇고 그런 동그랗고 검은 헤드폰 안에서는, 그렇게 휘발된 텍스트들이, 그렇게 다시 소리가 되어 발음되고 이어지며 새롭게 물질화되고 있었다. 나는 그 육화(incarnation)의 순간을 희미하게, 그러나 그 희미함만이 내게 어떤 뚜렷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오직 그런 의미에서만 희미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육화란 실체(substance)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빈곳(vide)을 만드는 작업, 존재(presence)를 구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재(absence)를 증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김온이 그의 다른 작품 <잃어버린 나라의 앨리스 읽기 또는 읽어버린 나라의 앨리스 잃기>에서 ‘수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업 역시 정확히 바로 이것이다). 나는 그렇게 실종된 문자들을 부활시키며 다시 다른 자리로 소환하는 그 육화의 목소리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다. 바로 그 전시장에서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직접 들었던 김온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러한 나의 기우와 기대가 뒤섞인 낯선 예견이 익숙하게 맞아떨어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4
그 익숙함은 기이하며, 반대로 그 기이함은 익숙하다. 그렇다, 기억해보면, 나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김온을 ‘목소리’로 처음 만났었다. 그리고 이후 김온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들을 일별하고 그것들을 떠올릴 때─그리고 또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말을 차용하자면, 김온의 작품들이 그렇게 시도하여 실패하고 다시금 더 잘 실패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떠올릴 때─나는 이러한 만남의 방식, 곧 소리라고 하는 ‘사라지는 매개’로 만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라보았던 방식이 개인적으로 매우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어쩌면 운명이란 건 시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각의 형태로 ‘이미-언제나’ 오는 것,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그렇게 도래하며 또한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때 이 작가가 유령의 목소리를 불러내는 초혼(招魂)의 연습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시각의 이행 혹은 폐기라는 의도적이고 극단적인 작업의 방식을 통해 기이하게도 그 시각의 ‘시점’을 청각을 통해 되살려내고 또한 바꿔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5
말하자면, 김온은 소리를 읽기 위해 시각이 어떻게 듣기를 연습할 수 있는지를, 말 그대로 ‘연습’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연습의 다른 이름은 아마도 실험일 테지만, 그러한 연습이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무언가가 될지 안 될지를 불확실하고 서투르게 시험하는 시론적(試論的) 실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시각을 낯선 청각의 층위에서 다른 형태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시론적(詩論的) 실험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김온의 작업은, 그것이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의 경계를 문제 삼는다는 의미에서, 정확히 시론(詩論)의 작업에 부응하며 또한 해당한다. 아마도, 바로 그때, 바로 그곳이었을 것이다, 내가 김온의 작업이 지닌 현기증 나는 ‘표층의 심도’를 어렴풋이 예감했던 때와 곳은(그렇다, 그것은 무엇보다 ‘表層의 深度’라는 형용모순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무엇이다).
6
2009년의 흑석동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시간과 가장 실체적인 장소를 떠나, 그 작업의 초현실과 과현실을 맞닥뜨렸던 곳은, 아마도 바로 그때, 바로 그곳이었을 것이다, 그럴 것일 텐데, 김온의 다른 작품들의 제목을 빌리자면, 또한 아마도 그때란 <세상의 모든 옛날들(Tous les passes du monde)>처럼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 그리고 그곳이란 <그 오래된 망상(Cette ancienne chimere)>들처럼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가 될 것이었다(여기서 나는 이렇듯 이러한 사태를 오직 미래완료의 시제로서밖에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내가 느꼈던 어떤 ‘가능성’의 느낌이란 김온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던 어떤 ‘불가능성’의 성격으로부터 곧바로 파생되고 있었던 셈이고, 나는 그러한 파생의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의 ‘비시간성’과 그 장소의 ‘비장소성’을 이미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불가능한’ 느낌이 나의 손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움직여 지금의 이 텍스트를 자동(적으로) 기술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럴 것이었다, 그럴 것이었다고, 나는 다시금 미래에 완료될 불가능과 불완전의 시제를 발음한다, 소리로서/써, 소리가 가능케 하는 저 불가능의 시각으로서/써. 나는 김온을 그렇게 만났다.
7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듣기를 위한 쓰기 연습(exercice d'ecrire pour ecouter)을 해야 할 때와 곳. 나는 그때와 그곳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나의 시제를 바꾼다. 내가 김온을 두 번째로 (그리고 비로소 아마도 ‘온전하게’) 만났던 것은 그와 나의 협업 퍼포먼스 <Dialogue Sound-Writing>을 통해서였는데, 그 퍼포먼스 안에서 그는 나에게 악보를 그려주었고(그러나 그의 악보란 통상적인 약호와 약속의 체계로서 일관된 독해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악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악보를 보고 연주했으며(그러나 나의 음악 역시 그 악보를 문자적이거나 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서로 간주하는 연주가 아니었다), 나의 연주는 다시 그의 쓰기 안에서 채록되었고 나는 다시 그렇게 채록된 악보로 연주를 계속했다. 따라서 이 협업 퍼포먼스는 악보 아닌 악보와 연주 아닌 연주가 서로를 준거 아닌 준거(reference)로 삼아 펼치는 일종의 표층적인 혹은 기표적인 놀이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놀이 안에서 진행되는 ‘개입/상호-참고(interference/inter-reference)’의 과정이란 곧 문자이거나 문자가 아닌, 혹은 분절이거나 분절이 아닌 ‘회화적’ 에크리튀르(ecriture)를 하나의 악보로 삼아 ‘독보(讀譜)’와 ‘채보(採譜)’ 사이를 오가며 김온의 글쓰기/그리기와 나의 즉흥연주가 서로 교차하고 병치되는 어떤 순환의 고리─곧 문자(악보 아닌 악보)와 음성(소리 아닌 소리)의 시간적 선후관계 내지 기원의 위계관계가 모호하고 결정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적 순환의 고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러한 순환의 고리와 매우 상동적인 형태로, 일종의 ‘듣기를 위한 쓰기 연습’을 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8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역설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내가 들으려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이며, 김온은 바로 이러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리는 것으로, 그것도 그 청각의 경험을 통해 시각예술의 영역을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이러한 연습이란, 김온이 알려준 어떤 길을 따라서, 아니, 김온이 들려준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매뉴얼’이라고 발음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정해진 순서와 논리를 따르는 확정된 설명서가 아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그 매뉴얼이란 분명 처음에는 일종의 ‘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 책은 일직선의 시간 순서를 따르지도 않고 기승전결의 논리적 서사를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김온의 작품 안에는 언제나 ‘책’이 있다, 책의 ‘형태’와 ‘구조’가 있으며, 그러한 형태와 구조가 일종의 ‘효과’로서 표출하고 산출하는 어떤 ‘소리’의 형식이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책의 ‘유령’이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그리고 그 유령은 ‘소리 나는’ 혹은 ‘소리 내는’ 유령이다). 그 책이란, 그의 책의 유령이란, 물론 우선 하나의 물질이며, 그것이 그렇게 물질인 한에서, 오직 그러한 한에서만, 나는 그 ‘책’의 ‘유령’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다시 말해 되돌아오지 않는 심령적인 형태가 아닌, 언제나 새롭게 되돌아오는(revenant) 가장 물질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서, 나는 오직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만 그렇게 ‘유령’이라는 이름을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것.
9
김온의 작업 안에서 일견 단순히 텍스트 혹은 문자들의 집합으로 생각되는 ‘책’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정신성을 담고 있는 추상명사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물질인 불순하고 유물론적인 보통명사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김온은 일견 일차적으로 보이는 ‘순수함’이라는 구성된 기원의 성격에 앞서 ‘불순함’이라는 일견 이차적으로 보이는 성격이 구조적으로 선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직시’의 방식이 청각에 기반하고 있고 또 기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시각’예술이 지닌 ‘청각적’ 특이점을 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목소리는 그 자체로 착종되어 있지만, 바로 그렇게 착종되어 있다는 의미와 이유에서, 그 목소리는 우리의 시공간을 흐트러뜨리는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중핵으로서 등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김온은 바로 이러한 중핵을 자신의 작업 안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것.
10
그렇다면 이는 실로 ‘불가능한’ 기획이 아닌가. 말하자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 포착 불가능한 것을 포착한다는 것, 이것은 예술이 개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예술은 철학이 아니며 철학이 되어서도 안 되기에) 동시에 바로 그러한 개념을 관통하고 횡단하려는 하나의 기이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그 스스로 어떤 예술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되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 방법론의 형식으로서 하나의 연습이자 실험이 되고자 하는데, 이는 어쩌면 예술이 (스스로 개별적 분과로 고립되어 남으려는 예술-내재적인 방식을 통해 주장하는 고유성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성/단독성(singularity)을 드러내는 유일한 형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김온은 불가능한 시론을 통해 가능한 예술의 영역에 가닿고자 하는 것, 혹은 어쩌면 반대로 가능한 청각의 형식을 통해 불가능한 시각의 형태에 가닿고자 하는 것, 그러한 (불)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11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시각적 의미의 심층으로부터 청각적 기표의 표층으로(du profond du sens visible a la surface du signifiant audible). 미술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착오적이고 심지어 반시대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물음이 위치하는 때와 곳은 언제이고 어디일까. 미술이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비시각적인 것을 시각화하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김온이 시도하고 있는 청각의 조형화 방식이 지닌 의미를 반추해봐야 하지 않을까. 김온의 작업에 발견되는 낭독의 어떤 고고학, 음성의 어떤 계보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시 묻자면, 듣기란 어디서 시작하는가. 어쩌면 묵독과 낭독 사이에서, 따라서 내면이라는 정신성과 책이라는 물질성 사이에서,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서. 김온이 끊임없이 ‘보기’를 위해서 ‘듣기’를, ‘보이기’를 위해서 ‘읽기’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유이다.
12
다시 한 번, ‘보다’라는 동사가 포괄하는 미학의 일반적 영역에서 ‘듣다’라는 동사가 제안하는 정치의 특수한 균열로. 예를 들어 나는 이 시점에서 <과자의 문학적 혁명(La revolution litteraire d'un biscuit)>과 같은 김온의 작품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거기서 과자에 함유된 성분 표시를 읽는 김온의 목소리는 마치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상품을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전복의 방식으로 ‘고발’하는 역설적 고해성사의 방식처럼 느껴진다. 또한 동시에 나는 김온이 나와의 또 다른 협업 <강 같잖은 평화: 목소리, 음악, 소음이 있는 삼면화(Peace unlike any river: a triptych with vox, music and noise)>에서 시도했던 색인(index) 읽기의 방식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거기서 색인의 중립적인 단어들은 그것이 매우 건조하게 낭독되고 따라서 발견됨으로써 그 각각이 일종의 기표적 생명력을 가진 생물 혹은 괴물로 변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김온이 자신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통해 육화되는 텍스트들을 통해 보여주는 어떤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기획이다.
13
그리하여, 다시 듣기의 표면들(surfaces of listening). 듣기에는 표면들이 있으며, 좀 더 적확하게 말하자면, 듣기에는 오직 표면들만이 존재한다. 듣기란 그렇게 표면에서 완성되는 무엇, 그렇게 (오직) 표층(만)을 따라 움직이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김온에게 ‘듣기’ 혹은 ‘읽기’란, 예술의 강조점을 심층적 의미에서 표층적 기표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또한 본질의 의미를 묻는 형이상학적 미학에서 표면의 효과를 묻는 정치적 미학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저 ‘표층적 기표’가 실종된 문자의 자리, 끊임없이 사라지고 미끄러지는 문자의 지위를 오직 음성의 측면에서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환기이며, 그러한 환기는 언제나 시각을 청각의 층위에서 재배열하는 일종의 시청각적 소격효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청취의 표면들이 드러내는 응시의 지층들을 어떻게 목격할 것인가. 아마도 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이 김온의 작품을 ‘들을’ 수 있기 위한, 따라서 ‘볼’ 수 있기 위한 알파의 물음이자 오메가의 물음일 것. 하여, 나는 다시 김온과 ‘만나기’ 위하여, 김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바로 그 목소리로 그려내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 물음을 함께 묻기를 제안해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소리를 ‘읽기’ 위한 시각의 ‘듣기’ 연습을 위하여.
-
전시문의
갤러리 팩토리
전화 : 02-733-4883
이메일 : master@factory483.org
웹사이트 : www.factory483.org
Overview
Title :Surfaces of Listening
Duration : May. 18, 2012 - June. 10, 2012
Artist : Kim On
Reading Sound Performance : June. 9, 2012, Sat. 8:00pm
Hours : Tue.- Sun. 11:00 a.m. - 6:00 p.m.
Inquiry
Gallery Factory
Tel : 02-733-4833
E-mail : master@factory483.org
Website : www.factory483.org



- 부대 프로그램
-
-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2006.5.19_6.11
-
-
-

- (최)슬기와 (최성)민의 (넓은 의미에서) 타이포그래피
- 2006.4.21_5.13
-
-
-

- People Call Me Madame Owl
- 2006.3.24_4.15
-
-
-

- 2006 이주영 프로젝트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 2006.2.25_3.19
-
-
-

- 한글꼴이 걸어나오다
- 2005.11.15_12.4
-
-
-

- Tinker
- 2005.10.12_11.6
-
-
-

- 마음
- 2005.9.3_9.25
-
-
-

- Surreally Real! : 미술, 혹은 마술
- 2005.6.15_6.30
-
-
-

- 고가현 개인전 <사람-형태소>
- 2005.1.14_3.13
-
-
-

- 이면공작裏(異)面工作 시나리오
- 2005.1.14_
-
-
-

- Park +
- 2004.11.5_12.5
-
-
-

- 하늘 공연장 Open Theater
- 2004.9.17_10.20
-
-
-

- My Style Your Style
- 2004.8.27_9.12
-
-
-

- 한여름 밤의 꿈
- 2004.8.10_8.22
-
-
-

- 우울증에 걸린 집
- 2004.7.9_7.31
-
-
-

- 나는 니가 행복했으면 해
- 2004.6.11_6.27
-
-
-

- 목성
- 2004.4.28_5.23
-
-
-

- 엔트로듀싱
- 2004.3.26_4.1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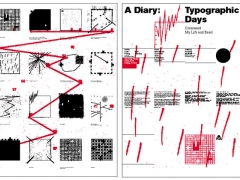
- A Diary: Typographic Days
- 2004.2.20_3.21
-
-
-

- Window Exhibition
- 2003.11.25_12.14
-